
‘디디에 에리봉’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쓴 두 권의 책,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와의 대담집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와 미셸 푸코 평전 〈미셸 푸코, 1926~1984〉를 통해서다. 그 책들은 주인공보다 그들에게 ‘말 거는’ 저자의 욕망이 더 표 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걸출하고도 기묘했다. 바꿔 말하면, 타자의 삶을 서술하는 ‘평전’에서조차 그는 ‘신뢰할 만한 서술자’가 되기보다는, 자기도취적이고 유머러스한 자신을 드러내는 데 더 소질 있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그가 비판적인 ‘자기기술지’(autoethnography) 〈랭스로 되돌아가다〉를 출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랍지 않았다. 다만, 그간 그가 게이로서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분석해온 것과 다르게, 이 책에서는 자신이 노동자계급 출신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계급적 수치심을 탐구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는 자신이 ‘젊은 게이’로서 살기 위해 시골마을인 랭스를 벗어나 파리로 이주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출신 계급을 숨겨야 하는 또 하나의 ‘벽장’으로 들어간 것과 같았다고 술회한다.
물론 파리지앵이 되어 뒤늦게 프랑스 지식사회에 적응한 그는 여전히 노동자의 가치를 지지한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게서 발견되는 ‘실제’ 노동자는 동성애 혐오와 인종 혐오를 내면화하고, 물질에 속절없이 매혹되며, 극우 정당에도 종종 투표한다. 노동자계급의 이 같은 결핍된 교양과 파시즘적 경향을 ‘자신의 일부’로서 간직하고 또 부정해온 저자는 바로 그 때문에, “노동자의 자생적 지식” 운운하는 자크 랑시에르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저자가 보기에, “노동자의 자생적 지식”이란 없거나, 있다 해도 특정 정치 형식과 연계된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예컨대, 저자가 낙태 경험이 있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낙태의 권리에 반대하는 극우 정치인 르펜에게 투표할 수 있느냐’고 질타하자, 어머니는 말했다. “아! 그건 아무 관계 없어. 내가 르펜에게 투표한 건 그래서가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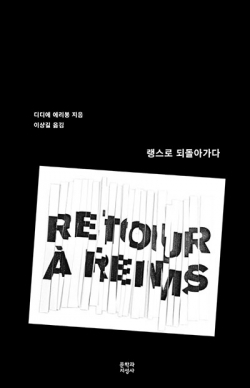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교육 기회를 ‘자발적으로’ 박탈하고 전형적인 진로로부터 ‘일탈’할 때, 실은 그 ‘자발적 선택’과 ‘일탈’조차 이미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과도한 사회결정론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는 부르주아 사회가 자신에게 특정 앎을 허용하지 않은 대신, 게이 커뮤니티의 하위문화를 학교 삼음으로써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쓴다. 무엇보다 이 책은 ‘노동자의 앎’이란, ‘이제는 노동자계급에서 벗어나 상층계급에 진입한 사람’에게서 쓰인다는 불문율을 따른다는 점에서 정말 어떤 ‘코드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다만, 그는 자신의 노동자계급 가족이 “내 책의 독자가 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라고 단언했으나, 그의 가족은 이 책을 읽은 후 “가족의 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불평했다.
디디에 에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기’는 결코 ‘다시 노동자 되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되돌아가기’는 결국 지금의 자신을 “재발명”하기 위한 시도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모든 것을 전일적으로 ‘코드화’하는 사회와, 그럼에도 ‘다른 존재가 되려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맺는 긴장과 공모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다. 모든 탁월한 자기기술지는 바로 그걸 한다.
